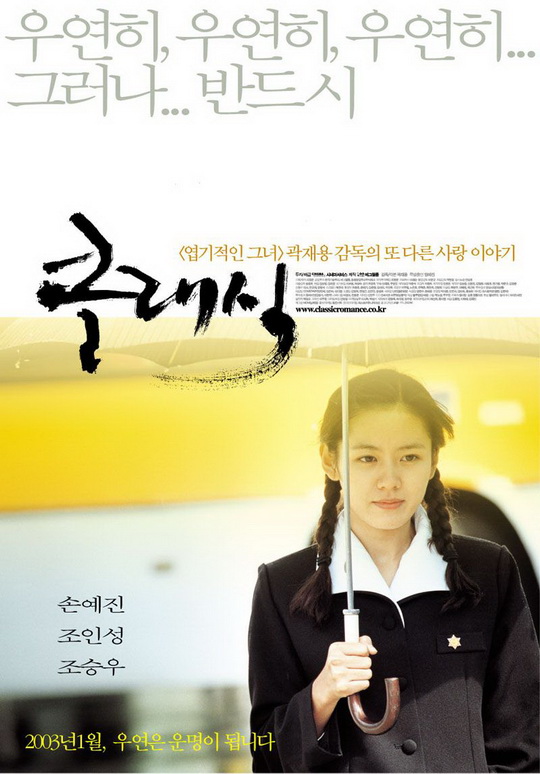
08년 1월 24일 현재 네이버 영화순위 47위
선임의 강력추천으로...
친구와 극장에서 봤었던 클래식... ^^
오랜만에 다시 한 번 보니...
감회가 무척 새롭다. 그 당시에도...
입영열차에 몸을 실은 조승우의 얼굴을 보며 참 안타까워하고...
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...
조인성이 조승우의 아들 역이라는 건...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되었지만... ^^;
역시... 조승우의 감성어린 연기...
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변치않는(아~ 조금은 변했을까나... ^^;) 손예진의 미모...
예전엔 몰랐지만 나의 중학교 졸업앨범에 사진이 남아있는 지금은 톱스타 조인성의 어색한 연기...
이 작품과 연애소설을 통해...
본인의 이미지가 여성스러움으로 굳어지는 걸 싫어라한 손예진이지만...
남자들이 대개 첫사랑하면 떠올리는 청순가련한 소녀 역에 누구보다 어울린다...
그리고...
무엇보다도...
그런 캐릭터의 모습 - 남자들의 로망 - 을...
자신이 쓴 시나리오로 직접 연출한 곽재용 감독이...
너무나도 부러워져서... 나도 꼭 한 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... ^^*
* 첨부파일은 클래식 시나리오입니다.
 invalid-file
invalid-file





